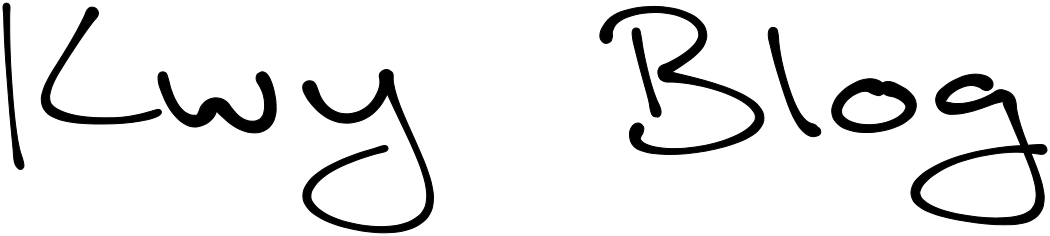2025년 10월 24일 일간 경제 리포트 – PM
## 2025년 10월 24일: 글로벌 불확실성 속 국내 경제의 기로
### 주요 경제 동향 요약
* 글로벌 경제: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가운데, 테슬라 실적 부진 및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상반된 요인이 작용하며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러시아 석유 기업 제재로 인한 유가 상승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또한, 일본 총리 교체와 맞물린 엔화 약세 현상 또한 주목해야 할 세계 경제의 변수입니다.
* 국내 경제: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.50%로 3회 연속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. 이는 수도권 집값 불안정 심화, 원/달러 환율 상승 압력 지속(1440원대 진입), 그리고 미국발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. 또한, 식량 자급률 하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### 시장별 상세 분석
* 미국 증시:
* 종합: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출발했으나, 마감 시점에서는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. (다우존스: -0.09%, S&P 500: +0.21%, 나스닥 종합: +0.40% ~ +0.57% 범위)
* 하락 요인: 테슬라의 기대 이하 3분기 실적 발표 (매출 281억 달러, EPS 0.50달러)와 유가 급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
* 주목 요인: 오늘 발표될 9월 미국 CPI 수치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연준의 10월 28~29일 FOMC 회의에서는 0.25%p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* 한국 증시:
* 종합 (10/23 마감): 코스피는 장중 3900선을 잠시 돌파했으나, 결국 0.98% 하락한 3845.56으로 마감했으며, 코스닥 역시 0.81% 내린 872.0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
* 개별 종목 및 이슈:
* AI 반도체/엣지컴퓨팅 기업 ‘노타’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(10/24) 마감되며, 11월 3일 코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.
* ‘휴림로봇’의 경우 6000원대 지지 여부가 단기 주가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* 공모펀드의 직상장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되어, ‘대신코스피200인덱스’, ‘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’ 등 2개 상품을 필두로 공모펀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* 주요 경제 지표 및 정책 (한국):
* 식량 안보: 2023년 칼로리 자급률이 32.5%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, 식용 곡물 자급률 역시 1990년 대비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식량 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.
* 금 시세: 한국 금현물(1g) 가격은 전일 대비 0.19% 상승한 197,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단기 조정 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.
* 환율:
* 원/달러 환율은 1,430.40 KRW (오후 시세) 수준을 기록하며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.
* 원/엔 환율은 9.412694 KRW (오후 시세) 수준입니다.
* 가상자산:
* 비트코인 (BTC/KRW)은 158,152,600 KRW (오후 시세)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
—
총평: 현재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. 국내 경제는 이러한 대외 환경 속에서 환율 및 물가 안정, 그리고 식량 안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.
기대/우려 종목/분야:
* 기대: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에너지 및 방산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* 우려: 고금리 환경 지속 및 환율 불안은 소비재, 내구재, 그리고 금리가 민감한 금융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식량 안보 관련 취약성은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